|
|
百濟國 舊唐書卷199上-列傳第149上-百濟國-12/01 ⊙<百濟國>, 本亦<扶餘>之別種, 嘗爲<馬韓>故地, 在京師東六千二百里, 處大海之北, 小海之南. 東北至<新羅>, 西渡海至<越州>, 南渡海至<倭國>, 北渡海至<高麗>. 其王所居有東西兩城. 所置內官曰內臣佐平, 掌宣納事; 內頭佐平, 掌庫藏事; 內法佐平, 掌禮儀事; 衛士佐平, 掌宿衛兵事; 朝廷佐平, 掌刑獄事; 兵官佐平, 掌在外兵馬事. 又外置六帶方, 管十郡. 其用法: 叛逆者死, 籍沒其家; 殺人者, 以奴婢三贖罪; 官人受財及盜者, 三倍追贓, 仍終身禁錮. 凡諸賦稅及風土所産, 多與<高麗>同. 其王服大袖紫袍, 靑錦袴, 烏羅冠, 金花爲飾, 素皮帶, 烏革履. 官人盡緋爲衣, 銀花飾冠. 庶人不得衣緋紫. 歲時伏臘, 同於中國. 其書籍有《五經》·子·史, 又表疏 依中華之法. 백제국(百濟國) 백제국(百濟國) 역시 본래 부여(夫餘)의 별종으로 일찍이 마한(馬韓)의 옛 땅에 있었으니 경사의 동쪽 5천2백 리에 있으며 큰 바다의 북쪽 그리고 작은 바다의 남쪽에 자리하고 있다. 동북쪽으로 신라(新羅)에 이르고 서쪽으로 바다를 건너 월주(越州)에 이르며 남쪽으로 바다를 건너 왜국(倭國)에 이르고 북쪽으로 바다를 건너 고려(高麗)에 이른다. 그들의 왕이 거처하는 곳은 동쪽과 서쪽에 두 개의 성이 있다. 내직으로 두는 관직은 내신좌평(內臣佐平)이라 하여 조칙의 출납을 관장하며 내두좌평(內頭佐平)은 곳간의 일을 관장하며, 내법좌평(內法佐平)은 예절과 의식에 관한 일을 간장하며 위사좌평(衛士佐平)은 숙위(宿衛)를 서는 군사에 관한 일을 관장하며, 조정좌평(朝廷佐平)은 형벌과 옥사의 일을 관장하며 병관좌평(兵官佐平)은 대외적인 군대의 일을 관장한다. 또 밖으로 대방(帶方) 여섯을 두어 열 개의 군(郡)을 관리한다.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반역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집안은 관가에서 몰수하며 살인자는 세 배의 노비로서 속죄하게 하며 벼슬아치로서 재물을 받거나 도적질을 한 자는 장물의 세 배를 추징하고 아울러 종신토록 금고형(禁錮刑)에 처한다. 무릇 모든 부역과 조세 및 기후와 토질 및 산물은 고려와 대부분 같다. 왕의 복식은 큰 소매의 자줏빛 도포에 푸른 비단으로 된 바지와 까마귀빛 검은 비단의 관에 금꽃으로 장식을 하며 흰 가죽띠에 까마귀 빛 검은 가죽신을 신는다. 벼슬아치들은 온통 붉은 비단으로 옷을 지어 입고 은꽃으로 관을 장식한다. 서민들은 붉거나 자주빛으로 옷을 해입지 못한다. 해마다의 절기 및 삼복과 납일 등은 중국과 같다. 서적으로 오경 및 자서와 사서가 있으며 또 표(表)와 소(疏) 등은 모두 중화의 법도에 의지하고 있다. 舊唐書卷199上-列傳第149上-百濟國-12/02 ⊙<武德>四年, 其王<扶餘璋>遣使來獻果下馬. 七年, 又遣大臣奉表朝貢. <高祖>嘉其誠款, 遣使就冊爲<帶方郡王>·<百濟王>. 自是歲遣朝貢, <高祖>撫勞甚厚. 因訟<高麗>閉其道路, 不許來通中國, 詔遣<朱子奢>往和之. 又相與<新羅>世爲 敵, 數相侵伐. <貞觀>元年, <太宗>賜其王璽書曰: [王世爲君長, 撫有東蕃. 海隅遐曠, 風濤艱阻, 忠款之至, 職貢相尋, 尙想徽猷, 甚以嘉慰. 朕自祗承寵命, 君臨區宇, 思弘王道, 愛育黎元. 舟車所通, 風雨所及, 期之遂性, 咸使乂安. <新羅王><金眞平>, 朕之藩臣, 王之 國, 每聞遣師, 征討不息, 阻兵安忍, 殊乖所望. 朕已對王姪<信福>及<高麗>·<新羅>使人, 具 通和, 咸許輯睦. 王必須忘彼前怨, 識朕本懷, 共篤 情, 卽停兵革.] <璋>因遣使奉表陳謝, 雖外稱順命, 內實相仇如故. 十一年, 遣使來朝, 獻鐵甲雕斧. <太宗>優勞之, 賜綵帛三千段幷錦袍等. 무덕(武德618~626)4년에 그들의 왕 부여장(夫餘璋)이 사신을 보내와 과하마(果下馬)를 바쳤다. 7년에 또 대신을 보내 표를 올리고 조공하였다. 고조가 그 정성을 가상히 여기고 사신을 파견하여 가서 대방군왕백제왕에 책봉하였다. 이로부터 해마다 사신을 보내 조공을 하였으며 고조는 그 노고를 위무하기를 매우 후하게 하였다. 송사(訟事)로 인해 고려가 조공의 길을 폐쇄하고 중국과의 왕래를 허락치 않자 조서를 내리고 주자사(朱子奢)를 파견하여 가서 화해시켰다. 또 신라와 더불어 대대로 서로간에 원수로 삼으며 수 차례 서로 침략하고 정벌하였다. 정관(貞觀627~649) 원년에 태종이 그 왕에게 새서(璽書)를 하사하여 이르기를 [왕은 대대로 군장이 되어 동쪽의 울타리에서 백성들을 위무하고 있었소 바다의 구석진 멀디 먼 곳으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어렵고도 험한 길을 충정과 정성으로 이르러 조공의 직분을 이으며 훌륭한 계책을 높이 여겨 유념하니 매우 가상하고도 위안이 되는구료. 짐은 삼가 영광스러운 명을 받들고 임금으로서 천하에 군림하였으니 왕도를 넓히고 백성을 사랑으로 기를 것이오 배와 수레가 교통하고 바람과 비가 미치는 곳은 바라건대 천명에 순종하여 두루 빠짐없이 편안하게 다스려질 것이오 신라왕 김진평(金眞平)은 짐의 번신(藩臣)이요 왕의 이웃나라인데 매번 들리기로 군대를 보내어 정벌하는 일을 그치지 않으며 군사의 강함을 믿고 잔인한 짓을 하고만 있으니 기대하는 바에 매우 어그러지는 일이오 짐이 이미 왕의 조카 신복(信福) 및 고려와 신라의 사신에 대해서 칙서를 갖추고 왕래하며 화해하게 하였으니 모두 함께 화목해야 할 것이오 왕은 반드시 저들과의 예전 원한은 잊어버리고 짐의 본 마음을 깨달아 함께 이웃의 정을 돈독히 함으로써 곧 전쟁을 그치길 바라오] 하였다. 장이 그리하여 사신을 보내고 표를 올려 사죄의 말을 늘어 놓으며 비록 겉으로는 명에 순종할 것을 일 컬었으나 안으로는 실제 서로 원수로 지내기가 여전하였다. 11년에 사신을 보내 와서 예방하고 쇠갑옷과 조각한 도끼를 바쳤다. 태종이 노고를 특별히 대접하고 채색 비단 3천 단과 비단 도포 등을 하사하였다. 舊唐書卷199上-列傳第149上-百濟國-12/03 ⊙十五年, <璋>卒, 其子<義慈>遣使奉表告哀. <太宗>素服哭之, 贈光祿大夫, 賻物二百段, 遣使冊命<義慈>爲柱國, 封<帶方郡王>·<百濟王>. 十六年, <義慈>興兵伐<新羅>四十餘城, 又發兵以守之, 與<高麗>和親通好, 謀欲取< 項城>以絶<新羅>入朝之路. <新羅>遣使告急請救, <太宗>遣司農丞<相里玄奬>齎書告諭兩蕃, 示以禍福. 及<太宗>親征<高麗>, <百濟>懷二, 乘虛襲破<新羅>十城. 二十二年, 又破其十餘城. 數年之中, 朝貢遂絶. 15년에 장(璋)이 죽자 그 아들 의자(義慈)가 사신을 보내 표를 올리고 국상(國喪)을 고하였다. 태종이 소복으로 곡을 한 뒤 광록대부로 추증하였으며 물품 2백 단을 하사하고 사신을 파견하여 의자를 주국(柱國)에 책명하고 대방군왕 백제왕에 봉하였다. 16년에 의자가 군사를 일으켜 신라의 40여 성을 빼앗고 또 군사를 보내어 그곳을 지키며 고려와는 화친하여 좋게 왕래하였으며 당항성(黨項城)을 탈취하여 신라가 입조하는 길을 끊어버리고자 도모하였다. 신라가 사신을 보내 급히 구원을 청함을 아뢰니 태종이 사농승 상리현장(相里玄奬)을 파견하여 글을 지니고 두 오랑캐를 타일러 재앙되고 복록됨을 드러내 보이도록 하였다. 태종이 친히 고려를 정벌하기에 이르자 백제가 두 마음을 품고 허술함을 틈타 신라의 성 10개 성을 습격하여 격파하였다. 22년 또 10개 남짓의 성을 격파하였다. 수 년 동안 조공이 마침내 끊어졌다. 舊唐書卷199上-列傳第149上-百濟國-12/04 ⊙<高宗>嗣位, <永徽>二年, 始又遣使朝貢. 使還, 降璽書與<義慈>曰: 고종이 제위를 이으니 영휘(永徽650~655)2년에 비로소 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사신이 돌아가자 새서를 내려 의자에게 이르기를 舊唐書卷199上-列傳第149上-百濟國-12/05-(詔1/1) ⊙至如海東三國, 開基自久, 列疆界, 地實犬牙. 近代已來, 遂構嫌隙, 戰爭交起, 略無寧歲. 遂令<三韓>之氓, 命懸刀俎, 尋戈肆憤, 朝夕相仍. 朕代天理物, 載深矜愍. 去歲王及<高麗>·<新羅>等使 來入朝/$[及]字各本原作[攻], 據《全唐文》卷一五改.$/, 朕命釋 怨, 更敦款穆. <新羅>使<金法敏>奏書: [<高麗>·<百濟>, 脣齒相依, 競擧兵戈, 侵逼交至. 大城重鎭, 爲<百濟>所倂, 疆宇日蹙, 威力 謝. 乞詔<百濟>, 令歸所侵之城. 若不奉詔, 卽自興兵打取. 但得故地, 卽請交和.] 朕以其言旣順, 不可不許. 昔<齊><桓>列土諸侯, 尙存亡國; 況朕萬國之主, 豈可不 危藩. 王所兼<新羅>之城, 宜還其本國; <新羅>所獲<百濟> 虜, 亦遣還王. 然後解患釋紛, 韜戈偃革, 百姓獲息肩之願, 三蕃無戰爭之勞. 比夫流血邊亭, 積屍疆 , 耕織 廢, 士女無聊, 豈可同年而語矣. 王若不從進止, 朕已依<法敏>所請, 任其與王決戰; 亦令約束<高麗>, 不許遠相救恤. <高麗>若不承命, 卽令<契丹>諸蕃渡<遼澤>入抄掠. 王可深思朕言, 自求多福, 審圖良策, 無貽後悔. [바다 동쪽의 세나라는 터전을 연지 이미 오래로서 모두 강역의 경계가 열지어 있으니 땅의 형세가 참으로 개의 어금니와 같이 맞물려 있소. 근대 이래 마침내 서로의 미움으로 틈이 생기고 얽혀드니 전쟁이 엇갈려 일어나기에 편안한 해가 거의 없었소. 마침내 삼한의 백성들로 하여금 목숨은 도마 위 칼 끝에 걸려 있게 하며 창을 찾아들고 제멋대로 분풀이하는 일이 아침저녁으로 연이어지는구료. 짐은 하늘을 대신하여 사물을 다스림에 있어 심히 가엾게 여기오, 원수진 원한들을 풀고 다시 정성과 화목을 돈독히 하라 하였소. 신라의 사신 김법민(金法敏)이 아뢰는 글에서 "고려와 백제는 입술과 이빨처럼 서로 의지하며 다투어 군사를 일으켜 번갈아 침략하고 핍박하기에 이릅니다. 큰 성과 중요한 고을들은 모두 백제에 의해 병탄되었으니 강역은 날로 줄어들고 위세와 기력은 모두 시들어 버렸습니다. 바라건대 백제에 조서를 내리시어 침략한 성에서 돌아가도록 하여 주십시오 만약 조서를 받들지 않는다면 곧 스스로 군사를 일으켜 쳐서 쟁취할 것입니다. 단지 예전에 땅을 얻고는 곧 서로간에 화해를 청할 것입니다." 하였으니 짐은 그 말에 순리가 이씩에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소. 옛날 제 환공(桓公)은 열국(列國)의 제후로서 망해가는 나라를 받들어 보존하였으니 항차 짐은 만국의 주인으로서 어찌 위기에 빠진 번국(藩國)을 근심하지 않을수 있겠소? 왕이 병합한 신라의 성은 모두 마땅히 그 본국으로 반환해야 할 것이며 신라에서 노획한 백제의 포로들 역시 왕에게 돌려보낼 것이오. 그러한 후에 근심을 풀고 분쟁을 해소하며 창을 넣어두고 갑옷과 투구를 가로누임으로서 백성들은 짐을 내려 어깨를 쉬게하는 소원을 얻게 되고 세 번국들은 전쟁의 노고가 없어질 것이오. 무릇 변방의 땅에 피가 흐르고 강토의 경계로는 주검이 쌓여 있으며 밭갈고 길쌈하는 것이 모두 폐지되어 남녀가 무료함에 견준다면 어찌 같은 시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오. 왕이 만약 진격을 멈추지 않는다면 짐 은 이미 법민(法敏)의 소청대로 그에게 맡겨서 왕과 더불어 결전 할 것이며 역시 영을 내리고 고려와 약속하여 머리 서로간에 어려움을 돕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오. 고려가 만약 명을 받들지 않는다면 곧 거란(契丹) 등 여러 오랑캐로 하여금 요택(遼澤)을 넘어가 노략질하게 할 것이오 왕은 가히 짐의 마을 깊이 생각하여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하고 훌륭한 계책을 살펴 도모하여 뒤에 후회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오 舊唐書卷199上-列傳第149上-百濟國-12/06 ⊙六年, <新羅王><金春秋>又表稱<百濟>與<高麗>·<靺鞨>侵其北界, 已沒三十餘城. <顯慶>五年, 命左衛大將軍<蘇定方>統兵討之, 大破其國. 虜<義慈>及太子<隆>·小王<孝演>·僞將五十八人等送於京師, 上責而宥之. 其國舊分爲五部, 統郡三十七, 城二百, 戶七十六萬. 至是乃以其地分置<熊津>·<馬韓>·<東明>等五都督府, 各統州縣, 立其酋渠爲都督·刺史及縣令. 命右衛郞將<王文度>爲<熊津>都督, 總兵以鎭之. <義慈>事親以孝行聞, 友于兄弟, 時人號[海東<曾>·<閔>]. 及至京, 數日而卒. 贈金紫光祿大夫·衛尉卿, 特許其舊臣赴哭. 送就<孫晧>·<陳叔寶>墓側葬之, 幷爲 碑. 6년 신라왕 김춘추(金春秋)가 또 표를 올려 백제 및 고려와 말갈(靺鞨) 등이 그들의 북쪽 경계를 침략하여 이미 30여 성을 함몰시켰다고 일컬었다. 현경(縣慶656~661)5년에 좌위대장군 소정방(蘇定方)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토벌하게 하니 그 나라를 크게 격파하였다. 의자 및 태자 융(隆)과 소왕 효연(孝演) 그리고 위장(僞將) 59명을 포로하여 경사에 보내자 상께서 그들을 문책하고 용서하여 주었다. 그 나라는 예전에 5부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37군(郡)과 2백 성(城)을 거느리고 가구가 76만이었다. 이에 이르러 그 땅을 나누어 웅진(熊進)과 마한(馬韓) 그리고 동명(東明)등 다섯 도독부를 두고 각기 주(州)와 현(縣)을 통치하게 하였으며 그들의 우두머리들을 세워 도독(都督)과 자사(刺史) 및 현령(縣令)으로 삼았다. 좌위랑장 왕문도(王文度)를 명하여 웅진도독으로 삼고 군사를 총괄하여 그곳을 진압하게 하였다. 의자는 어버이를 섬김에 그 효행이 알려졌고 형제에게 우애가 있으니 이때의 사람들이 부르기를 해동증삼, 또는 민자건이라고 하였다. 경사에 이르자 수일 만에 죽었다. 금자광록대부 위위경을 추증하고 그의 옛 신하들이 부복하여 곡하는 것을 특별히 허락하였다. 손호(孫皓)와 진숙보(陳淑寶)의 묘지 곁에 그를 장례 지내고 아울러 비석을 세워 주었다. 舊唐書卷199上-列傳第149上-百濟國-12/07 ⊙<文度>濟海而卒. <百濟>僧<道琛>·舊將<福信>率衆據<周留城>以叛. 遣使往<倭國>, 迎故王子<扶餘 >立爲王. 其西部·北部 城應之. 時郞將<劉仁願>留鎭於<百濟>府城, <道琛>等引兵圍之. <帶方州>刺史<劉仁軌>代<文度>統衆, 便道發<新羅>兵合契以救<仁願>, 轉鬪而前, 所向皆下. <道琛>等於<熊津江>口立兩柵以拒官軍, <仁軌>與<新羅>兵四面夾擊之, 賊衆退走入柵, 阻水橋狹, 墮水及戰死萬餘人. <道琛>等乃釋<仁願>之圍, 退保<任存城>. <新羅>兵士以糧盡引還, 時<龍朔>元年三月也. 於是<道琛>自稱領軍將軍, <福信>自稱霜岑將軍, 招誘叛亡, 其勢益張. 使告<仁軌>曰: [聞<大唐>與<新羅>約誓, <百濟>無問老少, 一切殺之, 然後以國付<新羅>. 與其受死, 豈若戰亡, 所以聚結自固守耳!] <仁軌>作書, 具陳禍福, 遣使諭之. <道琛>等恃衆驕倨, 置<仁軌>之使於外館, 傳語謂曰: [使人官職小, 我是一國大將, 不合自參.] 不答書遣之. 尋而<福信>殺<道琛>, 倂其兵衆, <扶餘 >但主祭而已. 문도(文度)는 바다를 건너다 죽었다. 백제의 승려 도침(道琛)과 옛 장수 복신(福信)이 군중을 거느리고 주류성(周留城)에 자리잡아 반란을 일으켰다. 사신을 보내 왜국(倭國)으로 가서 옛 왕자 부여풍(夫餘 )을 맞이하여 왕으로 세웠다. 그 곳의 서부와 북부에서 모두 배반하여 그에 호응하였다. 이때 낭장 유인원(劉仁願)이 백제부의 성에 남아 진영을 차리고 있었는데 도침 등이 군사를 이끌고 그를 포위하였다. 대방주자사 유인궤(劉仁軌)가 문도를 대신하여 군중을 통솔하고 가는 길에 신라의 군사를 일으켜 서로 맹세하고는 유인원은 구원하고 여러 곳으로 옮겨다니며 세워 전진하니 향하는 곳은 모두 굴복하였다. 도침등이 웅진강(熊進江)의 입구에서 두 개의 목책을 세우고 관군에 저항하자 유인궤가 신라의 군사와 더불어 사면에서 협공하니 적의 무리들이 패주하여 목책으로 들어가다가 물로 막혀 있고 다기는 좁아서 물에 떨어지거나 싸우다 죽은 자가 1만 여명이었다. 도침 등이 이에 유인원의 포위망을 풀로 임존성(任存城)으로 퇴각하여 수비하였다. 신라의 군사가 식량이 다하였다 하여 돌아가니 이때가 용삭(龍朔661~663)원년 3월이다. 그리하여 도침은 스스로 영동장군이라 칭하고 복신은 스스로 상잠장군이라 창히며 반란하고 도망한 자들을 유혹하여 불러들이니 그 세력이 점차 강해졌다. 유인궤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기를 [듣건대 대당이 신라와 더불어 약조하고 맹서하기를 백제인은 늙은이나 젊은이를 묻지 않고 모두 죽인 후 나라를 신라에 넘긴다고 하였소 그대로 앉아서 죽음을 받는 것이 어찌 싸우다 죽는 거소가 같을 것이오 그러한 까닭에 모여서 스스로 굳게 스스로 굳게 지킬 뿐이오] 하였다 유인궤가 글을 써서 재앙됨과 복록됨을 갖추어 진술하고 사신을 보내 그들에게 깨닫도록 일러 주었다. 도침등이 군중을 믿고 교만하여 인궤의 사신을 바깥 관사에 놓아두고 말을 전하여 이르기를 [ 사자의 관직은 작으나 나는 한 나라의 대장이니 만나서 스스로 섞일 수 없다] 하며 글에 답하지 않고 그를 보냈다. 얼마 있지 않아 복신이 도침을 살해하고 그의 군사와 무리를 아우르니 부여 풍은 단지 제사를 주재할 뿐이었다. 舊唐書卷199上-列傳第149上-百濟國-12/08 ⊙二年七月, <仁願>·<仁軌>等率留鎭之兵, 大破<福信>餘衆於<熊津>之東, 拔其<支羅城>及<尹城>·<大山>·<沙井>等柵, 殺獲甚衆, 仍令分兵以鎭守之. <福信>等以<眞峴城>臨江高險, 又當衝要, 加兵守之. <仁軌>引<新羅>之兵乘夜薄城, 四面攀堞而上, 比明而入據其城, 斬首八百級, 遂通<新羅>運糧之路. <仁願>乃奏請益兵, 詔發<淄>·<靑>·<萊>·<海>之兵七千人, 遣左威衛將軍<孫仁師>統衆浮海赴<熊津>, 以益<仁願>之衆. 時<福信>旣專其兵權, 與<扶餘 >漸相猜貳. <福信>稱疾, 臥於窟室, 將候<扶餘 >問疾, 謀襲殺之. <扶餘 >覺而率其親信掩殺<福信>, 又遣使往<高麗>及<倭國>請兵以拒官軍. <孫仁師>中路迎擊, 破之, 遂與<仁願>之衆相合, 兵勢大振. 於是<仁師>·<仁願>及<新羅王><金法敏>帥陸軍進, <劉仁軌>及別帥<杜爽>/$[杜]字各本原作[社], 據本書卷八四《劉仁軌傳》·《通鑑》卷二 一改.$/·<扶餘隆>率水軍及糧船, 自<熊津江>往<白江>以會陸軍, 同趨<周留城>. <仁軌>遇<扶餘 >之衆於<白江>之口, 四戰皆捷, 焚其舟四百 , 賊衆大潰, <扶餘 >脫身而走. 僞王子<扶餘忠勝>·<忠志>等率士女及倭衆 降, <百濟>諸城皆復歸順, <孫仁師>與<劉仁願>等振旅而還. 詔<劉仁軌>代<仁願>率兵鎭守. 乃授<扶餘隆><熊津>都督, 遣還本國, 共<新羅>和親, 以招輯其餘衆. 2년 7월에 유인원과 유인궤 등이 진영에 남아있던 군사를 거느리고 복신의 나머지 무리들을 웅진의 동쪽에서 크게 격파하여 그들의 지라성(支羅城) 및 윤성(尹城)과 대산(大山) 그리고 사정(沙井)의 목책을 쳐서 빼앗으며 죽이고 노획한 것이 매우 많으며 이에 영을 내리고 군사를 나누어 주둔시켜 지키게 하였다. 복신 등은 진현성(眞峴城)이 강에 임하고 높고 험하며 또한 길목의 요충지에 막아서는 곳이기에 군사를 보충하고 그곳을 수비하였다. 유인궤가 신라의 군사를 이끌고 밤을 틈타 성에 가까이 접근하여 사면에서 치(雉)로 기어올라 날이 밝을 때쯤 그 성에 들어가 점거하고는 8백 급의 머리를 베고 마침내 신라의 군량미 운송로를 통하게 하였다. 유인원이 이에 군사를 충원하여 줄 것을 주청하니 조서를 내려 치주(淄州) 청주(靑州) 내주(萊州) 해주(海州) 등의 군사 7천명을 징발하고 좌위위장군 손인사(孫仁師)를 파견하여 무리를 통솔하고 바다를 건너 웅진으로 향하게 하여 유인원의 무리를 도와주게 하였다. 이때 복신이 이미 병권을 전횡하니 부여풍과는 점차 서로 시기하고 의심하게 되었다. 복신이 병이라 일컬으며 석굴에 들인 방에 누워서 장차 부여풍이 문병하기를 기다렸다가 그를 불시에 살해할 계책을 세웠다. 부여풍이 이를 깨닫고 그가 가까이 하고 있는 신임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복신을 엄습하여 죽이고 또 사신을 고려와 왜국에 보내어 군사를 청하여 관군에 저항하였다. 손인사가 중도에 공격을 받았으나 격파하고 마침내 유인원의 무리와 더불어 서로 합치니 군사의 세력이 크게 떨치게 되었다. 그리하여 손인사(孫仁師)와 유인원(劉仁願) 및 신라왕 김법민이 육군을 거느리고 전진하였으며 유인궤 및 별수 두상(杜爽)과 부여융(夫餘隆) 등은 수군과 군량선을 거느리고 웅진강으로부터 백강(白江)으로 가서 육군과 만나 같이 주류성으로 향하였다. 인궤가 부여풍의 무리를 백강의 입구에서 만나 네번 싸워 모두 승리하고 그들의 배 4백 척 을 불사르니 적의 무리들이 크게 무너지고 부여풍은 몸만 빠져 달아났다. 위왕자 부여 충승(忠勝)과 충지(忠志) 등이 남녀와 왜의 무리들을 거느리고 항복하니 백제의 여러 성이 모두 다시 귀순하여 왔으며 손인사와 유인원 등은 군대를 정돈하여 돌아왔다 조서를 내려 유인원을 대신하여 유인궤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주둔하여 l키게 하였다. 이에 부여에게 웅진 도독을 제수하고 본국으로 돌려보내어 신라와 함께 화친하며 그 나머지 무리들을 불러모으게 하였다. 舊唐書卷199上-列傳第149上-百濟國-12/09 ⊙<麟德>二年八月, <隆>到<熊津城>, 與<新羅王><法敏>刑白馬而盟. 先祀神祇及川谷之神, 而後 血. 其盟文曰: 인덕(麟德664~666)2년 8월에 융이 웅진성에 도착하여 신라왕 법민과 더불어 백마를 잡아 맹서하였다. 먼저 하늘과 땅의 신령 및 하천과 계곡의 신에게 제사를 지네고 나서 피를 들이 마셨다. 그 맹서하는 글에 이르기를 舊唐書卷199上-列傳第149上-百濟國-12/10-(盟1/1) ⊙往者<百濟>先王, 迷於逆順, 不敦 好, 不睦親姻. 結託<高麗>, 交通<倭國>, 共爲殘暴, 侵削<新羅>, 破邑屠城, 略無寧歲. 天子憫一物之失所, 憐百姓之無辜, 頻命行人, 遣其和好. 負險恃遠, 侮慢天經. 皇赫斯怒, 恭行弔伐, 旌旗所指, 一戎大定. 固可 宮汚宅, 作誡來裔; 塞源拔本, 垂訓後昆. 然懷柔伐叛, 前王之令典; 興亡繼絶, 往哲之通規. 事必師古, 傳諸 冊. 故立前<百濟>太子司稼正卿<扶餘隆>爲<熊津>都督, 守其祭祀, 保其桑梓. 依倚<新羅>, 長爲與國, 各除宿憾, 結好和親. 恭承詔命, 永爲藩服. 仍遣使人右威衛將軍<魯城縣公><劉仁願>親臨勸諭, 具宣成旨, 約之以婚姻, 申之以盟誓. 刑牲 血, 共敦終始; 分災恤患, 恩若弟兄. 祗奉綸言, 不敢失墜, 旣盟之後, 共保歲寒. 若有棄信不 , 二三其德, 興兵動衆, 侵犯邊 , 明神鑒之, 百殃是降, 子孫不昌, 社稷無守, 祀磨滅, 罔有遺餘. 故作金書鐵契, 藏之宗廟, 子孫萬代, 無或敢犯. 神之聽之, 是饗是福. [지난날 백제의 선대왕은 거역과 순종의 길에서 방황하고 이웃과의 호의를 돈독히 하지 않으며 친인척과 화목하지 못하였다. 고려와 결탁하고 왜국과 교통하며 함께 잔인하고 난폭하게 신라를 침략하고 빼앗아 고을을 파괴하고 도성을 도륙하니 편안한 해가 거의 없었다. 천자께1서 하나의 물건일지라도 그 바른 자리를 잃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백성들의 무고함을 가련하게 생각하여 빈번히 명을 내려 사람을 보내어 화해하여 좋게 지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험난함에 의지하며 멀리 있음을 믿고 하늘의 도리를 업신여겼다. 황제께서 이에 노하여 엄속히 백성을 위로하고 반역자를 문죄하는 토벌을 행하니 깃발이 가리키는 곳에는 한 차례의 싸움으로 크게 평정되었다. 진신로 궁궐과 저택을 파내어 웅덩이로 만들어 뒤에 오는 후손에게 훈계를 삼을 것이며 원인과 근본을 파헤쳐서 후세에 교훈으로 드리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순한 자를 감싸안고 반경을 정벌하는 것은 앞선 왕들의 법칙이요 망한 것을 일으키고 끊어진 것을 잇는 것은 앞선 현인들의 공통된 규범이다. 일을 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옛것을 스승으로 삼는다는 것은 옛 서책에도 전해지는 것이다. 때문에 예전의 백제 태자 사가정경 부여융을 세워 웅진도독을 삼가 그 제사를 지키게 하고 그 고향을 지키게 하는 것이다. 신라에 의지하여 오래도록 동맹을 맺은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며 각기 묵은 원한을 없애 버려 화친으로 좋은 결실을 맺어야 할 것이다. 조서의 명을 삼가 받들어 영원히 번복의 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사자 우위위장군 노성현공 유인원을 파견하고 친히 임하게 하여 깨닫도록 권하고 화해의 교지를 자세히 펴는 것이니 혼인으로서 이를 약속하고 맹서로서 이를 아뢰는 것이다. 희생을 잡아 피를 마시고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돈독히 해야 할 것이니 재난은 나누어 가지고 환난은 구휼하며 서로 은혜하기를 마치 형제처럼 해야 할 것이다. 조서를 공경하여 받들어 감히 실추시키지 말 것이며 이미 맹서한 후에는 함께 절개를 지켜 보전하여 나갈 것이다. 만약 믿음을 버리거나 영 원하지 않은 채 그 덕이 변절하여 군사를 일으키고 군중을 동원하여 변방을 침범한다면 신령께서 이를 살펴보고 있음에 1백가지 재앙을 내릴 것이요, 자손이 번창하지 않을 것이며 사직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며 정결히 하고 제사를 지낸들 그 정성은 닳아 없어질 것인즉 남겨지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금으로 글을 쓰고 쇠로 새겨 이를 종묘에 깊이 간직하니 자손만대 혹시라도 감히 침범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신께서 이를 들으실 것이니 이로서 누릴 복이 결정되리라] 舊唐書卷199上-列傳第149上-百濟國-12/11 ⊙<劉仁軌>之辭也. 訖, 埋幣帛於壇下之吉地, 藏其盟書於<新羅>之廟. 유인궤의 글이다. 피를 마시는 예식이 끝나자 폐백을 단 아래의 상서로운 땅에 다 묻고 맹서의 글은 신라의 종묘에 깊이 간직하였다. 舊唐書卷199上-列傳第149上-百濟國-12/12 ⊙<仁願>·<仁軌>等旣還, <隆>懼<新羅>, 尋歸京師. <儀鳳>二年, 拜光祿大夫·太常員外卿兼<熊津>都督·<帶方郡王>, 令歸本蕃, 安輯餘衆. 時<百濟>本地荒毁, 漸爲<新羅>所據, <隆>竟不敢還舊國而卒. 其孫<敬>, <則天>朝襲封<帶方郡王>·授衛尉卿. 其地自此爲<新羅>及<渤海靺鞨>所分, <百濟>之種遂絶. 유인원과 유인궤가 이미 돌아가자 부여융이 신라를 두려워하여 얼마지 않아 경사로 돌아왔다. 의봉(儀鳳676~679) 2년에 광록대부 태상원외경 겸 웅진도독 대방군왕의 관직을 수여하고 영을 내려 본래의 번국으로 돌아가 나머지 무리들을 편안하게 돌보도록 하였다. 이대 백제의 본토는 황폐하게 훼손되어 점차 신라에 의해 점거되니 부여융이 결국에는 감히 옛 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었다. 그 손자 경을 측천의 조정에서 대방군왕에 피봉된 것과 위위경에 제수한 것을 답습하게 하였다. 그 땅은 그때부터 신라(新羅)와 발해말갈(渤海靺鞨)에 의해 나뉘어 졌으니 백제의 혈통은 마침내 단절되었다. |
|
http://www.1392.org/bbs?history91:96 |





| 

|
![[1] [1]](./data/board/member/img/1/i_31fd850c4e.gif) 김성
김성 619('10)-08-19 01:00
|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2] [2]](./data/board/member/img/1/i_1d91102185.gif) 김진교
김진교 622('13)-07-08 23:30
|
예전 학창시절 교과서 말고는 신당서를 접할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보니 새롭네요 감사합니다 | |



|
| 역사 자료실 최근 댓글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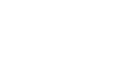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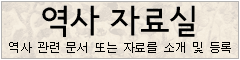
 서한
서한










 홍봉한
홍봉한 이신평
이신평

